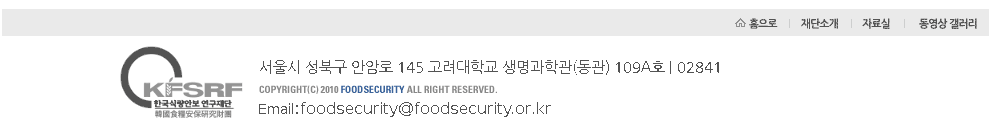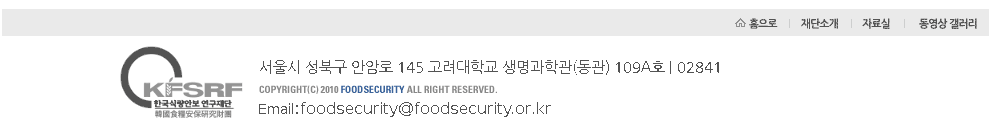식량이 무기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전략가 '제이미 그랜섬'이 작년 네이처 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곡식생산량이 매년 1.2% 낮아지면서 이제는 2013년 인구증가율과 비슷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2012년 11월의 농림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사료곡물 포함)이 지난 1990년 43.1%에서 2012년에는 22.6%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22.6%의 자급률 중 쌀을 제외하면 그 외 곡물의 자급률은 불과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느 경제학자가 말한 "선진국은 농업국가다" 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캐나다 180%, 프랑스 174%, 미국 125%, 독일 124%, 영국 101%등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넘으며, 우리와 여건이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4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삶 자체라고 말 할 수 있는 쌀의 자급률 역시 1990년 108.3%, 2005년 102%에서 2012년에는 83%까지 떨어졌다.
적절한 분배로도 기아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지고 있으며 식량난의 안전
지대가 사실상 없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70년대 식량파동시 쌀가격이 300%이상 급등하였고 80년대 냉해발생 때에는 우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으로 부터 평균 쌀가격 3배의 요구를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식량생산기반이 미흡하여 식량자급율이 떨어져 수요와 공급을 통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수있다.
우리의 주 식량인 쌀을 생산하는 논 면적 중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하는 '수리 답'은 79만ha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중 52만ha(66%)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7만ha(34%)는 지자체에서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공급에 필요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수문, 관정 등 각종 농업기반시설물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3,374개의 88%인11,775개소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규모가 큰 3천370개소 중 30년 이상된 것이 2천900개소로 86%이고 45년 이상은 전체의 71%인 2,385개소로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피해 문제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1만3천374개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및 99천km 용·배수로 유지관리로 517천ha에 농업용수 급·배수관리에 소요되는 연 3천30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2010년 까지는 연평균 1천500억원씩 국고가 지원되다가 2011년에 전액삭감 되었다가 2012년에는 770억원, 그리고 2013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체 유지관리비용의 37.6%인 1천243억원이 지원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족한 국고보조금의 증액확보로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식량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식량 무기시대를 대비하여 식량자급율 제고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