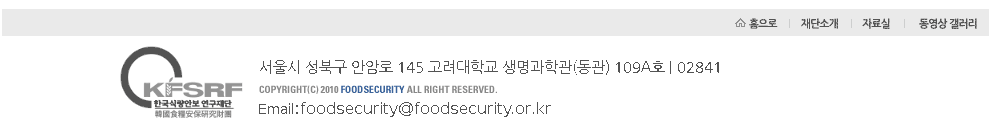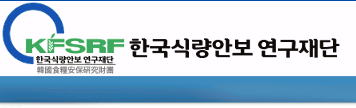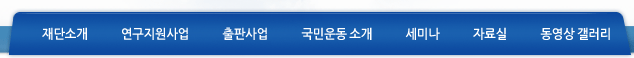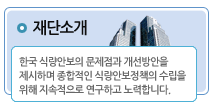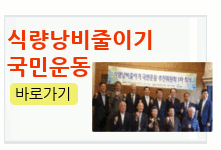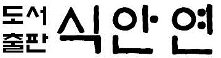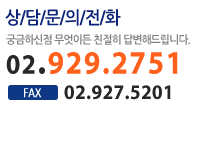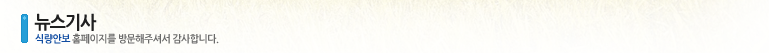|

글로벌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곡물의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곡물값과 연관성이 큰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제곡물유통회사 발족과 해외곡물기지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에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가곡물사업 방향
정부의 식량위기 대응방안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해외 저개발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해외농업개발(농장·생산형)과, 해외유통거점 확보를 통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유통형) 등 두가지 방향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1,400만t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를 카길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국제곡물메이저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불안정한 수입구조에서 탈피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해외유통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유통망 미확보로 실패했던 경험이 현재 정부가 유통시스템 구축을 우선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사업의 핵심축은 aT가 맡고 있다.
aT는 국제 운송 및 판매 등의 노하우를 가진 국내 대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국제곡물유통망을 확보해 오는 2020년까지 곡물수입량의 30%(400만t)을 국제곡물메이저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T는 지난해 12월 말 삼성물산·STX·CJ제일제당·한진 등 4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aT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한계와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곡물조달계획의 한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의 일차적인 문제는 사업의 실효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올 들어 2월18일까지 밀, 옥수수, 대두의 평균 선물가격은 2010년 평균가격 대비 각각 47.4%, 60.9%, 35.1% 상승했다. 이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2008년 평균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도 곡물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유통망 확보만으로 곡물을 도입할 수 있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25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식량조달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이우창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 대표가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통망 확보만으로는 곡물 도입이 어렵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곡물메이저의 견제를 뛰어넘어 계획대로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관건이다. 올해 aT가 우선 진출을 계획한 미국의 경우 곡물메이저의 안방이나 다름없다.
aT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망 가운데 메이저가 점유한 시설은 174개 강변엘리베이터 중 117개(64%), 수출엘리베이터 58개 중 25개(43%)로 사실상 곡물메이저가 유통망을 독과점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aT는 ‘메이저의 영향력이 적은 틈새시장, 특히 선진 미국시장에 우선 진출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이런 방향에 변화가 없어 우려를 더한다. aT는 2020년까지 총 2,376억원(공사 950억원, 민간기업 1,426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들여 해외 현지의 산지엘리베이터 12개, 수출엘리베이터 4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산지엘리베이터 투자계획 10곳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
김용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메이저와 경합을 최소화한다면서 메이저의 영향력이 큰 미국과 브라질을 우선 진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