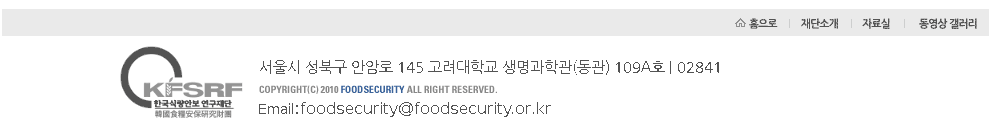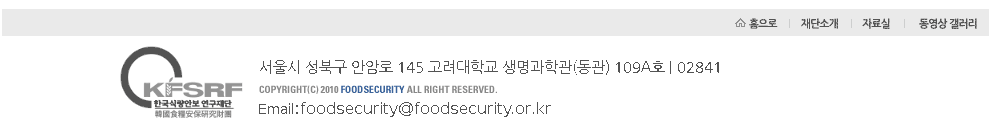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
언제 닥칠지 모를 세계적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확충, 지류·지천 정비 등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주 건국대 교수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업·농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해외농업개발 등을 통해 외국에서 식량을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식량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리시설물의 내한능력 및 홍수 배제능력 향상, 배수시설 확충 등의 다각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리안전답 비율 높여야
농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식량 생산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논 관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논 가운데 10년 빈도 이상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6%(53만8000㏊)에 불과하다. 19.6%인 18만8000㏊의 논은 아직도 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논은 내한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김선주 교수는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저수지·양수장·취입보 등을 매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또 현재 있는 시설도 대부분 노후화돼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수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7505개 가운데 1945년 이전에 준공된 것이 9082개(51.9%)에 달했고, 50년 이상 경과된 것은 2654개소(15.2%)였다. 30년 이내에 준공된 것은 904개소(5.2%)에 불과했다. 용·배수로의 경우 대부분 구조물이 아닌 토공으로 돼 있어 용수 손실 및 관리비용이 과다한 실정이다.
◆상습침수 농경지도 여전히 많아
물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배수문 등을 설치해 홍수를 막고 있지만,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비닐하우스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침수지역 23만2000㏊ 가운데 배수장 및 배수시설이 정비된 곳은 15만3000㏊(65%)에 불과하며, 7만9000㏊는 집중호우시 침수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홍수 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리시설 확충 및 개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설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배수기준이 논에 맞춰져 있어 농가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이러한 곳에 대한 배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직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충북의 경우 논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면적이 350㏊나 되며 이를 5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침수피해 대책은 별로 없다”며 “이에 대비해 우리도 어느 농산물이나 재배할 수 있는 ‘농지범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농경지 57%가 농지범용화돼 있다.
◆지류·지천 정비도 필요
지류·지천은 4대강 본류에 비해 홍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수질오염도가 높다. 저수지가 노후화돼 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김선주 교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둑높이기 사업이 더 필요한 지역은 지류·지천”이라며 “이 사업은 홍수와 가뭄 극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말 ‘저수지 하류하천 자원조사’를 통해 지류·지천 둑 높이기 대상지구 151개소를 선정했고, 2013년 조사·설계를 거쳐 201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했으나 2013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