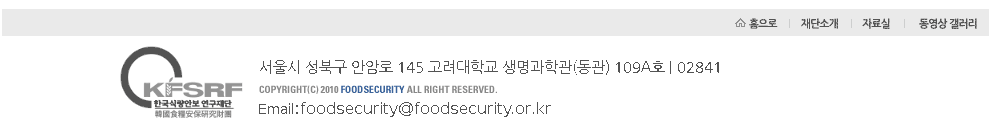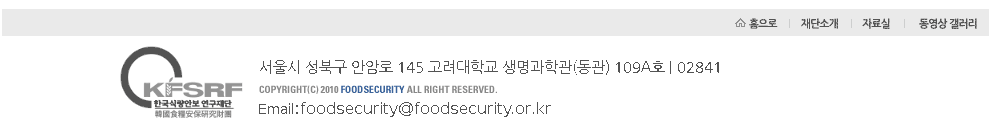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
“집단급식소 위생 매뉴얼 통일해야”…
‘위기의 식품안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4일 토론회
멜라민, 방사능, 발암물질…. 식품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소비자는 불안해한다. 보다 안심하고 맛있게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와 동아일보, 채널A는 국내 식품 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 2층에서 ‘위기의 식품안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기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그동안 추진된 식품안전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처럼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중소 규모의 식품업체와 농·어장은 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해 지키기가 쉽지 않다. 식품안전 관리규정이 실태 점검과 같은 사후 관리에는 다소 소홀한 점도 문제.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식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 위원은 “식중독 지수나 식품 상식, 월별 식품 소식을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매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혜경 창원대 교수는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발표한다. 문 교수는 “병원 급식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균 감염 때문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법의 위생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매뉴얼이 통일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도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실제로 급식을 제공받는 구성원이 50명 미만이면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아 지자체나 식약청의 위생 점검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위생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문 교수는 “원장과 조리원을 상대로 매년 한 차례 정도 하는 지자체의 위생교육이 형식적이다”라며 “보육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이 제공되는 곳이라면 모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식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됐고, 정부와 기업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정책팀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 정부가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특히 중소 규모 이하의 식품 관련 사업체는 정부가 별도 지원하고 관리하자는 얘기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