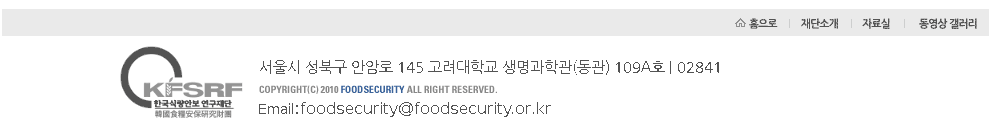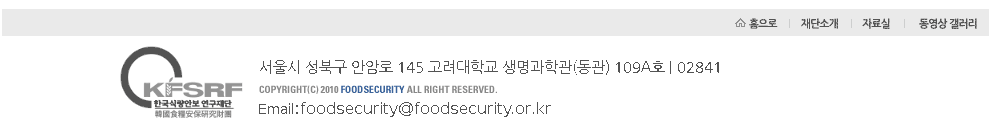제 목  |
|
[하상도 칼럼(50)] 소비기한 제도 논란 - 식품음료신문 |
[
2011-09-22 16:35:47 ]
|
|
|
글쓴이  |
|
링크 #1  |
http://www.thinkfood.co.kr/main/php/search_view.php?idx=44737
, Hit:
5976 |
|
소비기한 제도 논란
'소비기한’ 도입 명분 있고 시의적절
품질유지기한·유통기한 병행 사용을
|
|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가격”과 “유통기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 저장 특성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세 가지를 사용한다. “제조연월일”은 도시락, 식품첨가물 등 일부에 사용하고, ”품질유지기한“은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경과하더라도 판매와 섭취가 가능하다. 보통 저장성이 우수하고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으며, 소비자가 오래 보관하면서 먹는 식품에 한해 적용된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유통기한”은 “sell by date”의 개념으로 섭취 가능한 기한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즉, 마트에서 판매하는 기간이므로 구매 후 가정에서의 섭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식품의 종류마다 다르고 제조사와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 일단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판매업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폐기하고, 가정에서는 버리기도 하고 며칠 정도 지난 것에 한해 먹는 사람도 있고 몇 주가 지나더라도 맛, 냄새가 괜찮으면 찜찜하지만 먹는 사람도 있다.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엄청난 식품 반품과 폐기물을 줄여 범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원에서 작년 시중 유통 중인 냉장 빵류의 유통기한 경과 후 소비가능 기한을 검증한 실험결과, 최장 20일까지 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밝힌 것이 힘이 된 것 같다. 즉, 20일이나 더 먹을 수 있는 빵을 폐기하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난에 직면한 우리 현실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검토해야 될 시기라는 당위성을 제시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며칠 후 3개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소비기한 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을 늘여 기업을 배불려 주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선택 권리를 뻇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
현재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은 표준화된 방법에 의한 실험과 과학적 검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연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목표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안전마진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한다. 또한 반품과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기업만을 배불려 주는 것인가? 기업이 가격을 책정할 때 이미 이들 반품과 폐기물까지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면 이들이 감소될 경우 기업은 당연히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기업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도 깊다. 여하튼 소비자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견제와 조화를 추구하는 선진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제도와 정책이든 일장일단이 있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도 경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음식품 폐기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안전한 섭취 가능 식품이 폐기되고 있다.
금번에 추진하는 “소비기한”은 분명 명분이 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다만, 식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유지기한”은 유지하고,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유연하게 병행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네 가지의 다양한 표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된다. 너무 복잡하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것이 좋으나 효율성을 따지자면 다양한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로 커버하자. 다양한 제도의 활용이 선진 사회로 가는 첩경일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