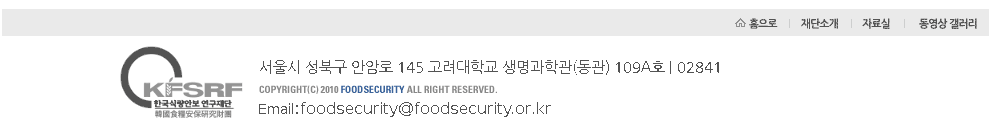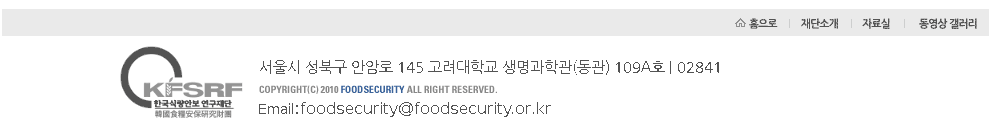식량자급률은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국내 농업생산의 대응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각국 정부는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식량정책 방향을 세운다. 따라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기조에는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왜 바꾸나=지금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6년 4월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일부 손본 뒤 이듬해 12월 법적 구속력이 약한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설정된 목표치는 자문위가 기준연도로 삼았던 2004년 자급률보다도 훨씬 낮다는 비판을 샀다. 2004년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65.3%였지만, 2015년 목표치는 54%에 불과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역시 26.8%에서 25%로 오히려 낮아졌다.
법제화도 당시 논란이 됐다. 농업계는 목표치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제6조), 세부 실천계획은 시행규칙인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너무 낮고 강제성도 약해 자급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5년마다 목표치를 재조정하도록 한 일정을 1년 앞당겨 올해 새로운 자급률 개념 및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어떻게 바뀌나=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안’을 보면(1면 <표 참조>) 품목별 자급률을 제외한 3대 자급률(주식·곡물·칼로리)이 모두 상향조정된다. 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그만큼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곡물자주율이란 새로운 개념도 도입된다. 세계적인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곡물을 자주적으로 들여올 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품목별 자급률은 쌀·밀·채소류·과일류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 육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기존 목표치 설정 당시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육류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을 당초 목표치만큼 끌고 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2020년 목표치도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2020년 목표치는 2015년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